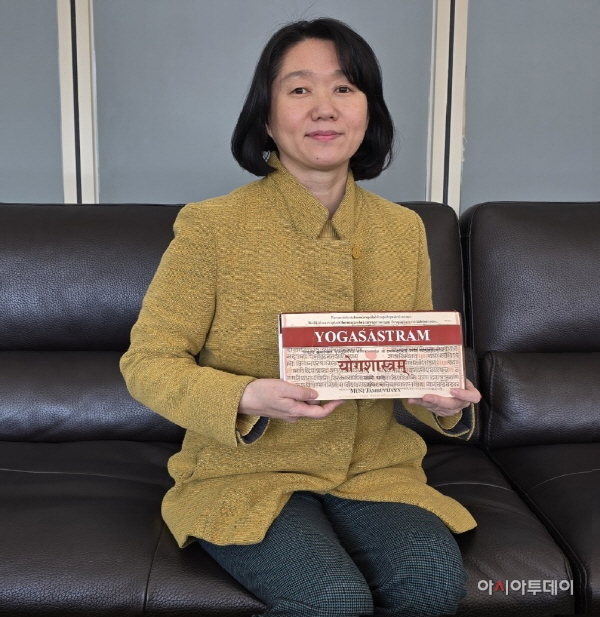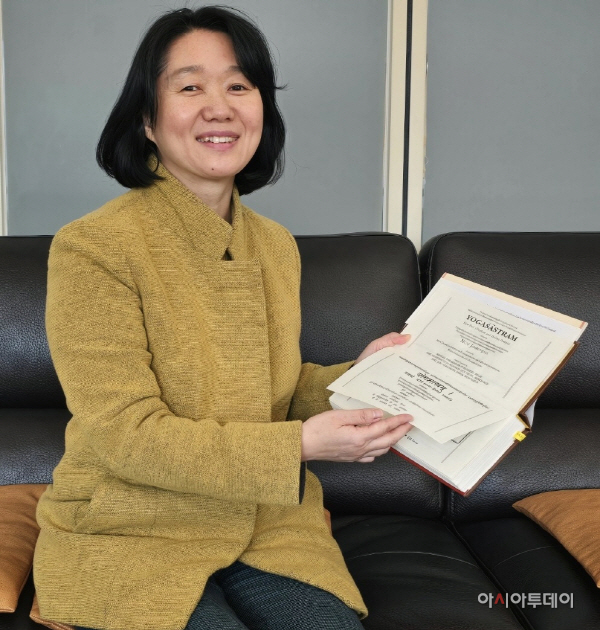자이나교 무소유, 불살생 엄격히 지켜
"VSED를 법제도적으로 검토할 때"
|
양영순 박사는 국내에선 보기 드문 인도 자이나교 연구자다. 양 박사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2010년 석사학위, 2019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에서 HK+학술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2023년도부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남아시아센터장 강성용 교수와 함께 일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난 양 박사는 우리 사회가 자이나교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생명에 대한 사랑, 사상적 관용, 비움의 정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 등 우리에게 약이 되는 처방이다. 다음은 양 박사와 나눈 대화다.
-자이나교를 불교의 쌍둥이 종교라고 비유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선 낯설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슈라마나(沙門) 전통이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 슈라마나, 불교에서 사문이라고 부르는 이 전통은 산스크리트어로 노력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집(세속)을 떠나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는 집단을 말한다. 자아니교는 기원전 5~6세기 '석가모니 붓다' 활동 당시에 불교보다 교세가 컸다. 자이나교의 실질적인 창시자 '마하비라'는 '석가모니 붓다'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배 수행자였다. 마하비라와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는 유사하다. 마하비라는 12년 6개월 수행 후, 석가모니 붓다는 6년 고행 후 깨달았다. 깨달은 이후 제자를 지도한 것도 같다. 자이나교와 불교 모두 남녀 출가자·재가자로 승가를 구성했다. 두 종교 모두 윤회의 고통 속에서 해탈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엄격한 자기수행을 한다."
-자이나교가 불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이나교는 불살생(不殺生)·남의 것을 빼앗는 것 금지·거짓말 금지, 음란하지 않을 것·무소유를 5대 서약(계율)으로 지켰지만 불교는 무소유를 음주를 금하는 것으로 바꿨다. 특히 출가자가 '아힘사(Ahimsa)'라고 불리는 불살생을 철저히 지키고 무소유가 5대 서약에서 빠진 것은 중요한 차이를 가져왔다. 자이나교는 무소유를 문자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는 나체 수행자도 생겼고, 사유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수행에만 집중하기에 재가(在家) 신자들이 사원을 관리하고 소유하며, 출가자를 지원한다. 초기불교의 출가 수행 전통이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퇴색한 감이 있지만 자이나교는 출가 정신과 계율 준수가 철저히 유지됐다."
-불살생을 그토록 철저히 지키는 교리적 이유는.
"모든 생명체에 '지바(jiva)'라고 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변하고 순수한 영혼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이나교다. 반대로 불교는 근본적인 실체가 있다는 표현을 피한다. 대신 무아(無我)나 공(空) 같은 말을 쓴다. 자이나교는 실체하는 모든 영혼이 윤회의 길을 같이 걷는 동료라고 본다. 아울러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윤회하는 것은 업에 의해 영혼이 물들었기 때문이고, 수행으로 업을 제거해서 순수한 영혼이 됐을 때 해탈한다는 개념이다. 자이나교 출가자들이 고행하는 것도 순수한 영혼에 붙은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치 광물에서 불순물이 제거돼 보석이 되는것과 같다."
-자이나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지혜를 줄 수 있나.
"우선 아힘사(불살생) 정신은 모든 방면에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자이나교는 정신적 차원의 아힘사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입장·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상적 관용·포용의 정신이다. 진실은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 견해들이 난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타자에 대한 포용과 기다림의 정신이 아힘사라는 사랑의 실천이라면, 이는 자신의 현재 견해를 소유하지 않고 놓아두고, 한 걸음 뒤에 두고 바라보는 무소유의 정신과도 연결된다. 무엇보다 무소유는 비움의 정신이다."
-자이나교는 죽음을 준비하는 종교라고 들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나라다. 우선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은 1위인 데다 지역·성별·정치 갈등은 극심해지는데 1인 가구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이미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면 더 극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반드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이나교는 고대 경전에서부터 '현명한 사람들은 살아 있을 때 온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강조한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전제 조건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신의 삶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아름다운 임종을 위해 자이나교의 살레카나(sallekhana)를 예로 들었다.
"자이나교에서는 단식을 통한 자발적인 존엄사인 살레카나(sallekhana) 수행 전통이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살레카나는 '좋은 소멸' '좋은 죽음'이란 뜻이다. 노년의 자이나교도가 명상과 단식을 동시에 하면서 스스로 임종에 드는 것으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자살과 다르다. 죽음을 준비한 불교 승려가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입적하는 것과 같다. 일반인 중에서도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이는 맑은 정신으로 임종하는 편이다. 이러한 죽음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깨어있는 온전한 죽음'의 모습이다. 살레카나를 현대의 'VSED(Voluntary Stopping of Eating & Drinking·자발적인 단식 존엄사)'로 접근해도 좋다. 서구에선 의료체제의 보호 아래 VSED가 실시되고 있다. 자이나교의 살레카나는 안락사보다도 존엄사의 일종인 VSED로 봐야 한다. 대안적인 존엄사인 VSED를 우리 사회도 검토하고 법제도적으로 수용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연구 중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본적으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힘·아름다움·젊음 등 삶의 밝은 면만을 환호하는 사회는 삶 속의 그늘을 더욱 짙게 드리운다. 누구나 늙고 병듦을 피할 수 없다. 몽테뉴는 '늙어감은 죽음의 연습'이라고 말했다. 죽음은 모든 존재의 숙명이다. 또한 죽음은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며 삶을 소중하게 살도록 하는 큰 스승이다. 한국은 거울이 있는 삶, 스승이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
|
|